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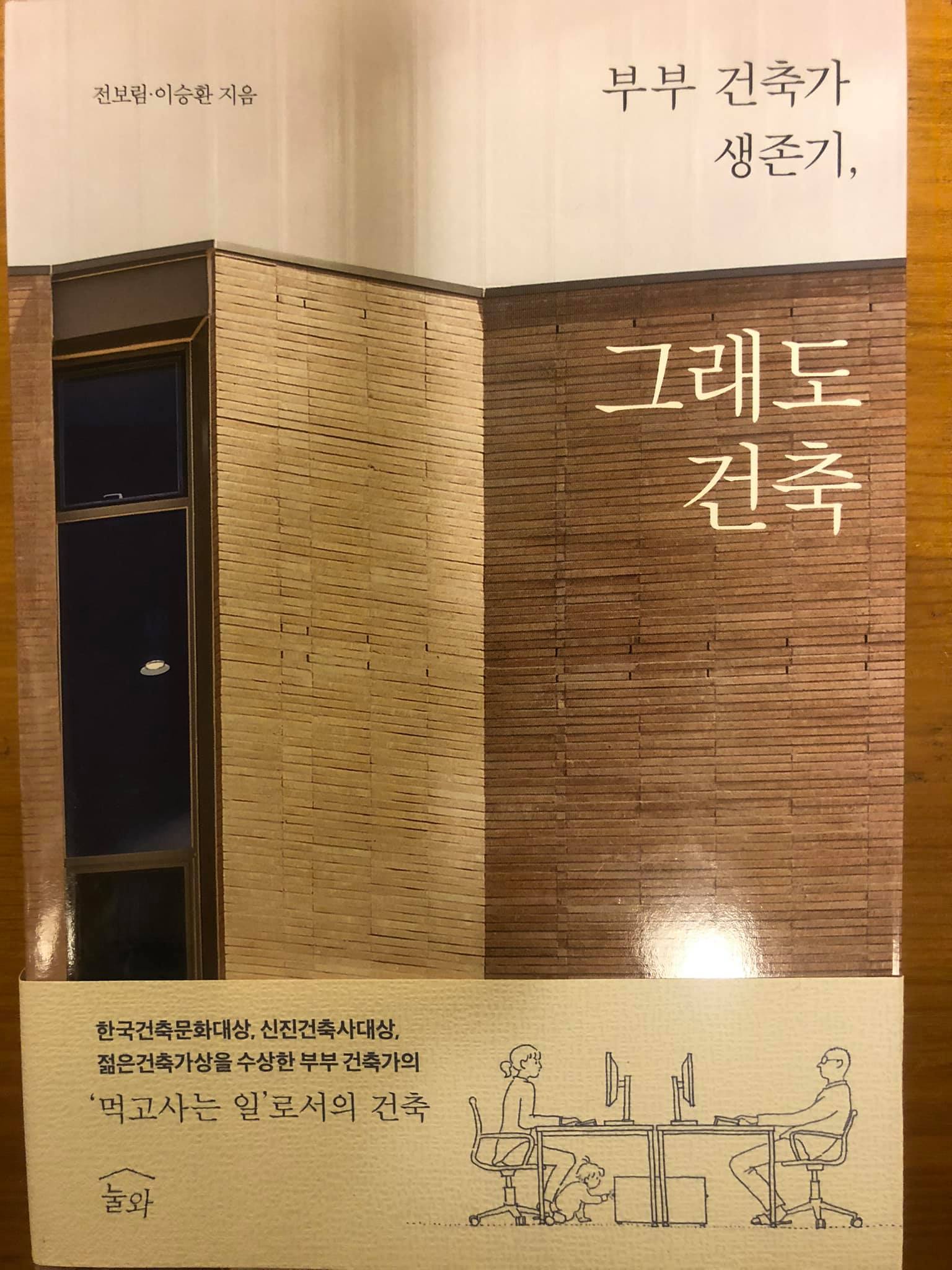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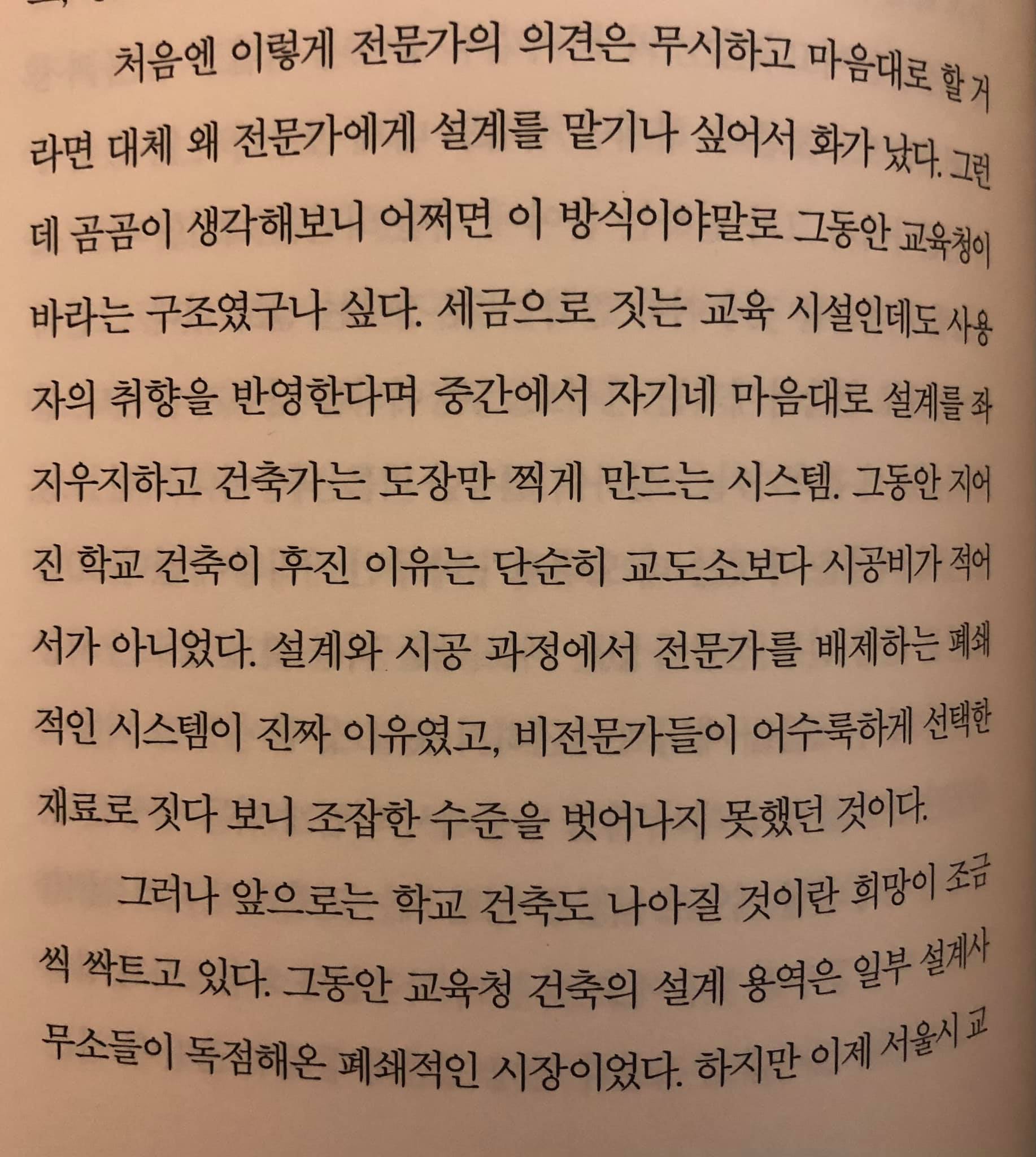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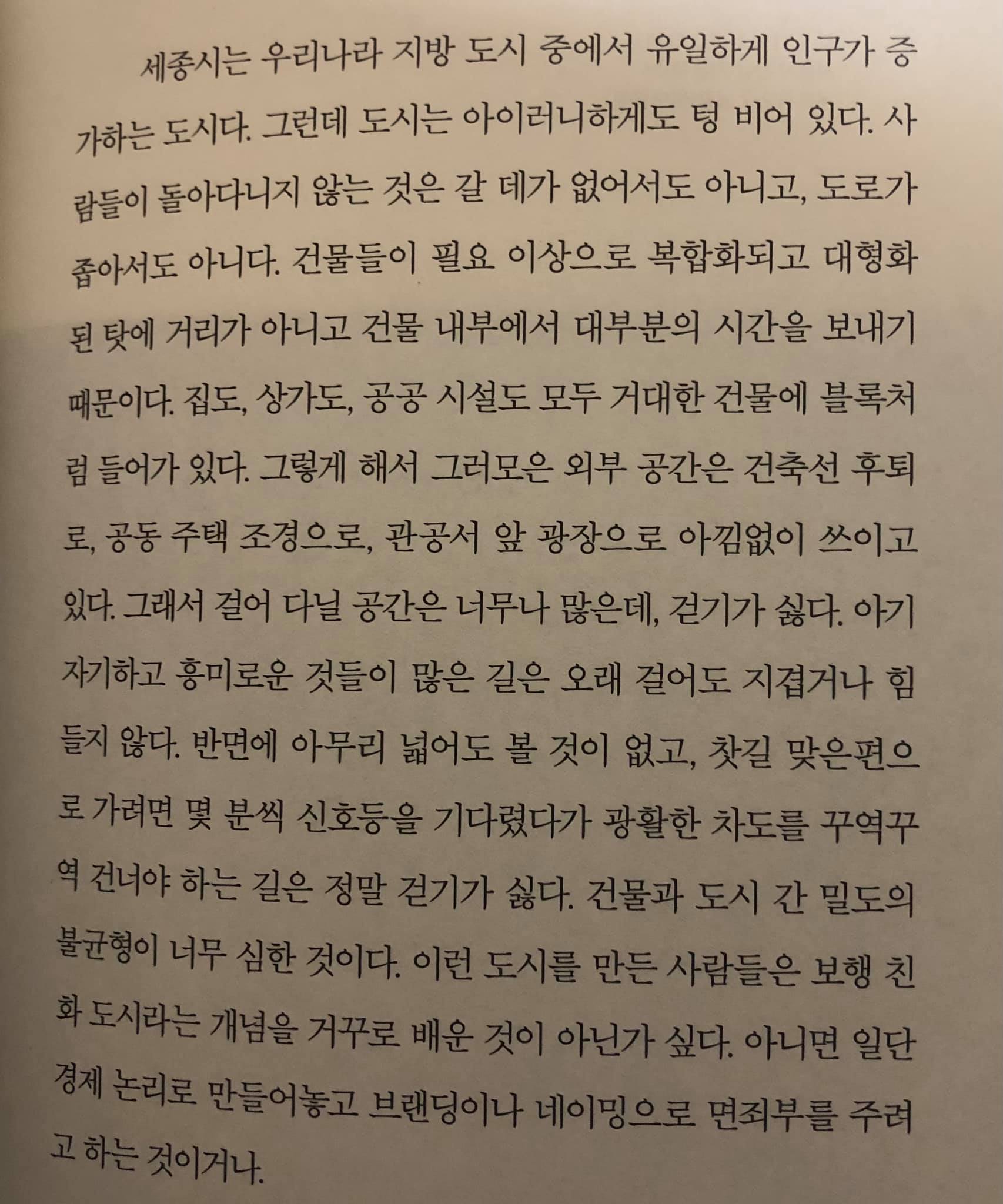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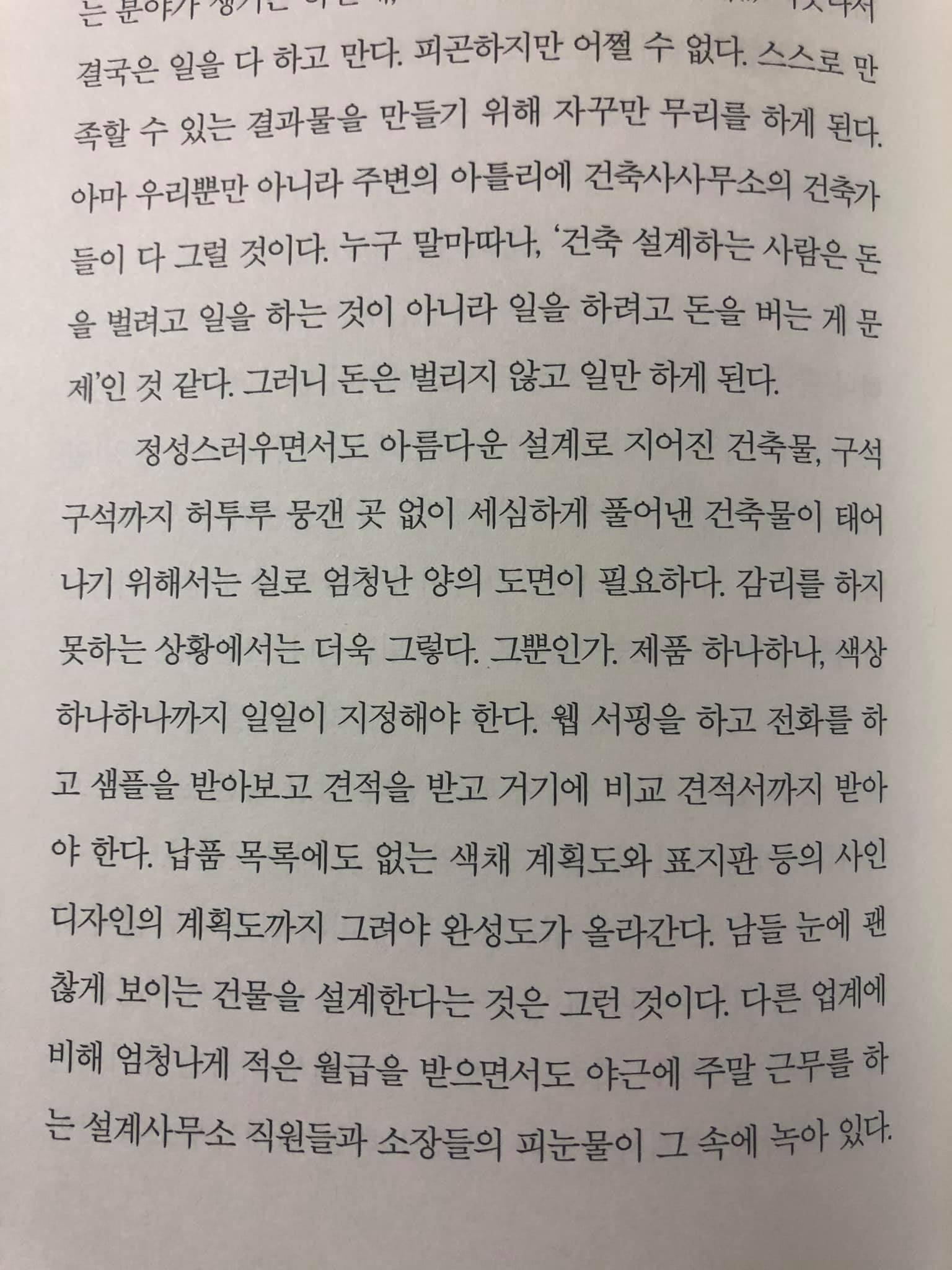
2019년 젊은건축가상 수상자에 관한 책에서 인상깊었던 IDR 건축사사무소 전보림-이승환 건축가님들의 '부부 건축가 생존기' <그래도 건축>.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에 250페이지 남짓이지만 공감하고 감탄한 부분이 정말 많네요. 제 올해의 책 후보입니다. 이런 책이 문체부 권장도서나 세종학술도서로 꼭 뽑혔으면 싶고요. '건축사'가 하는 '건축설계'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싶은 분들께 권하고 싶습니다.
조경과 조소를 전공했다가 건축과로 전과해서 건축설계를 하게 되었고, 부부 건축가가 된 이야기 (1부)
일거리가 없는 신출내기 개업 건축사무소 운영을 위해 공공 건축 공모를 했다가 경험하게 된 공공건축 설계와 현실 (2부)
기울인 노력에 비해 낮은 설계대가와 약탈적인 제도들로 인해 성실하게, 그리고 공공과 일을 할수록 사무실 유지가 어려워지는 개업 건축사들의 구조적 상황(제3부)
무조건 값싸고 빠르게만 요구해온 대한민국 건축설계 문화로 인해 우리가 희생한 것들과 바뀌어야할 건축사 업계의 문화(제4부)
로 쭉 이어지는 구성도 공감 수위를 높였고요.
며칠 전 페북에서 'K-팝' 'K-방역'처럼 앞에 'K'가 붙으려면 '충분히 훈련된 우수한 인력을', '적정보다 훨씬 못미치는 대가를 주고', '장시간 노동으로 부려먹어야' 한다는 포스팅을 봤습니다(어느 분이었는지와 정확한 워딩이 기억 안나네요.), '허가방'이 아닌 건축설계업이라는 본인의 업에 자부심이 있는 분들일수록 '일을 계속 하고 싶어서 사무실을 유지할 돈을 버는' 도저히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도승같은 직업생활을 해야하는 업계의 청년들을 공공과 업계 원로들이 착취하고 있는 것도 역시 'K' 답더군요.
도서관을 좋아해서 애용하는 입장에서 국립세종도서관과 울산 매곡도서관(저자분들이 설계한) 그리고 평범한 시립-구립 도서관들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로 다가옵니다.
예전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의 학교 강당은 비만 안새고 흙바닥이 아닌 마룻바닥이라는 사실만으로 감사히 이용했던 수준이었는데, 저자분들이 설계한 압구정초교와 언북중학교 다목적강당을 보니 좋은 공공건축물을 몰라서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다는 자조감이 들 정도입니다. 피쉬 앤 칩스와 배추전이 최고여~하던 사람이 파인 다이닝 코스라는 게 있다는 걸 안 것처럼. 망할 교피아들 ㅠ.ㅠ
건축 문외한의 입장에서 적정한 건축 설계비의 기준을 알기 어려웠는데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건축 설계비 산정 가이드>(한국건축정책학회)는 꼭 찾아보겠습니다.
공동저자이신 이승환 건축사님께서 행복도시 공공건축가로 위촉되셨는데 세종시에서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모시고, 설계 프로젝트도 많이 발주해서 제발 좀 만족스러운 공간 경험을 향유하며 살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공공의 수준을 자랑하는 절망스런 똥무더기 속에 그나마 살게 만들어주는 아파트들 밖에 없는 도시로 남아야 하는지. ㅠ.ㅠ
--------------------------------------------
82쪽
설계 공모 과정을 거치는 사업에만 한 해 우리나라 공공 건축에 쓰이는 28조 중 약 20%에 해당하는 6조 가까운 예산이 쓰인다. 만약 이 중 상당수가 공정하지 못한 심사로 결정된 허접한 설계안으로 지어졌다면, 이건 결코 설계비만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백보 양보해 그중 절반가량은 괜찮은 안이 선택된다 해도, 여전히 2~3조 원 남짓한 예산은 매년 수준 낮은 설계안으로 공공 건축을 짓는 데 낭비된다고 할 수 있다.
89쪽
설계 공모 공고에 심사위원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사에서 토론 과정이 필수로 있어야 하며 당선작 및 참가작 등 설계안과 그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전부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어져야 한다.
125쪽
사실 공공 건축에서 '어디에 있느냐'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용자를 배려한 똑똑한 설계나 성실한 시공 모두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위치만큼 시민의 편의를 크게 좌우하는 요소는 또 없기 때문이다. 지하철역에서 가깝거나 코앞에 여러 노선의 버스가 서는 정류장이 있는 등 소위 '높은 접근성'은, 공공 건축이라면 당연히 기본으로 갖추어야 할 미덕이다.
(중략)
공공 건축물은 반드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짓고 또 현재 위치보다 접근성이 나쁜 곳으로는 이사를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171쪽
설계비 = 직접 인건비 + 직접 경비 + 제경비 + 창작 및 기술료
실제 건축 설계비를 2019년 노임 단가를 적용해서 선출해보면 다음과 같다.(부가세 제외)
단독주택(60평, 2층, 경사지) : 4,200만 원
178쪽
적어도 내가 아는 선에서 공공 건축이란 무상 제공이라는 전제하에서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풍요로움이란 필수적인 기능을 충족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여분의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최소의 공사비와 최소의 설계비로 최단기간 안에 끝내야 하는 것이 바로 공공 건축이다. 더구나 그 최소의 설계비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설계사무소의 지속 가능성조차 보장해주지 않는다.
205쪽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제시하는 설계비 기준은 '허가방'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설계에 맞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대하는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그런 건 됐고 진짜로 얼마냐며 다그치듯 설계비를 깎는다. 우여곡절 끝에 기준 설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계약한 후에는 실제 일은 두 배, 세 배로 한다. 일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사무실 손익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일이 끝나려면 아직도 네 달은 더 남은 것 같다.
건축가가 바보라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설계를 하려다보니 들어가는 시간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다.
(중략)
디자인의 차이를 알고 그 디자인의 가치에 합당한 보수를 지불하는 소수의 이상적인 건축주들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은 선배 건축가들의 클라이언트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건축가를 일부러 찾아오지는 않는다.
'독서일기 > 도시토목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Erika Kotite] She sheds - a room of your own (0) | 2021.03.13 |
|---|---|
| [자크 클라인/김선형, 강경이 역] 캐빈 폰(2015), 캐빈 폰 인사이드(2019) (0) | 2020.11.28 |
| [젊은건축가상] 젊은 건축가 질색, 불만, 그리고 일상(2020) (0) | 2020.11.25 |
| [양동신] 아파트가 어때서(2020) (0) | 2020.11.11 |
| [명제근] 설계에서 시공까지(2020) (0) | 2020.11.0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