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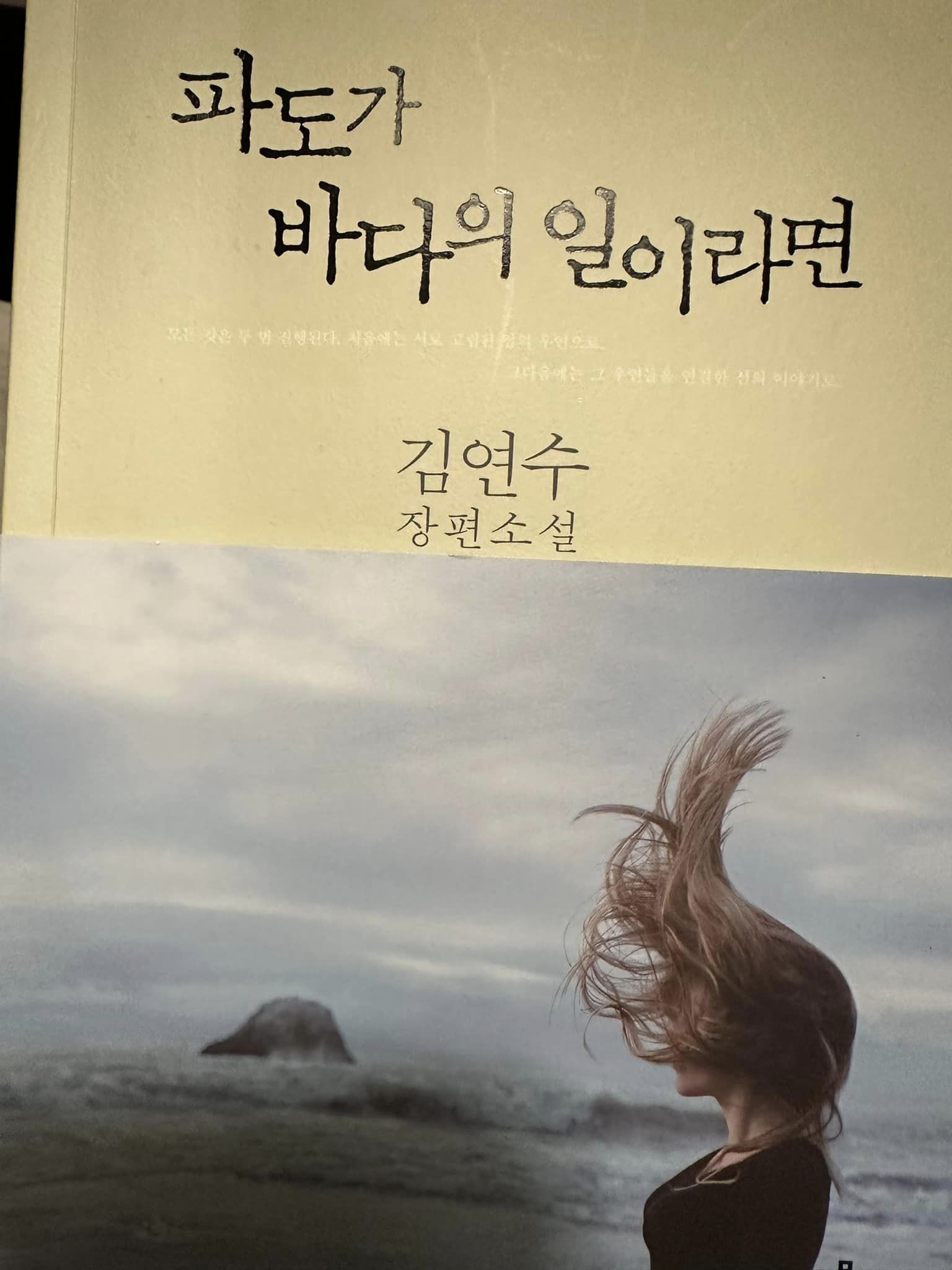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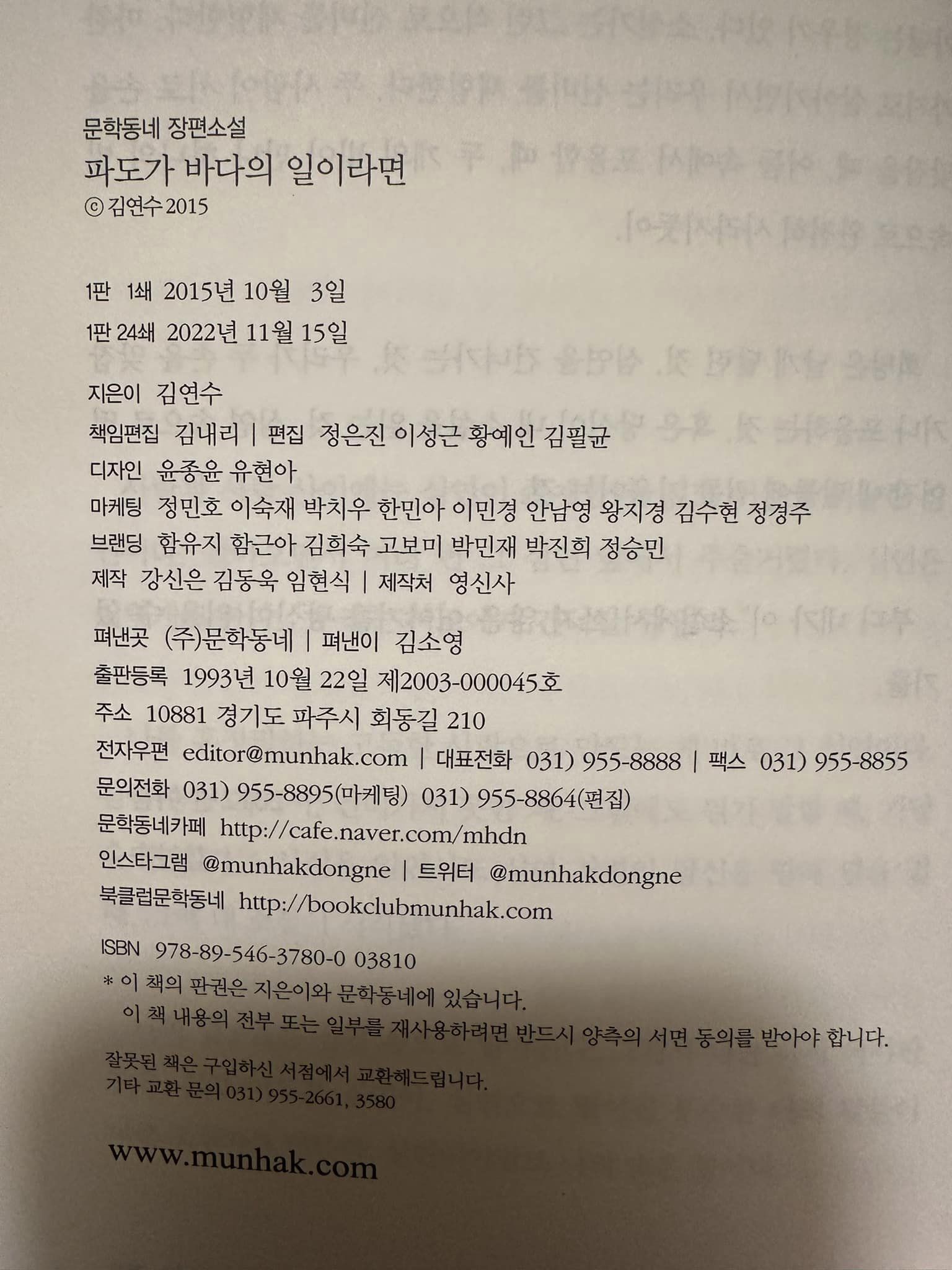
요즘 올해의 책을 너무 남발한 것 같아서 자제하려고 하지만 그만큼 연달아서 빼어난 책들을 만나니 즐겁습니다.
김연수 작가의 2015년에 나온 이 장편을 뒤늦게 봤네요. '지은과 그녀아 낳은 카밀라의 아버지'에 대해 중간에 대충 이후의 줄거리를 추측하고 덮을 뻔하던 참이었는데, 장이 바뀌고 그간 깔아놓았던 복선들을 회수하기 시작하네요. 저자의 능청맞음에 완전히 놀아났으면서도 감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페터 비에리의 <리스본행 야간열차>(2004)와 줄리언 반스의 맨부커상 수상작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2011)를 읽었을 때처럼 책을 덮었을 때 뒤통수를 쾅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수수께끼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스스르 풀리는 솜씨라니.
2015년에 나온 이 책이 왜 24쇄를 넘게 찍을 정도로 꾸준히 읽히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넷플릭스같은 OTT에서 충분히 시리즈 영상으로 만들만한 소재라고 생각되는데, 대신 그렇게 영상으로 옮기면 김연수 작가가 의도한 두 명의 '나'의 발화가 시차를 두고 겹치는 장치는 사용할 수 없어서 책의 매력을 다 담아내긴 어렵겠네요.
날개라도 달리지 않은 이상 건널 수 없는, 사람들 사이의 오해와 불가해의 심연에 대한 아름다운 소설이었습니다.
--------------------------------------------
168쪽
"저는 소문 같은 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본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자기 마음 하나 제대로 모르는 바보들이니까요. 저는 자기 마음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 무지한 마음이 무서울 뿐이죠."
244쪽
지은이가 그때 제게 말했어요. 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사람과 사람 사이를 건너갈 수 있니? 너한테는 날개가 있니? 그렇게요. 저는 말문이 턱 막혔어요.
'독서일기 > 국내소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해연] 홍학의 자리(2021) (0) | 2024.04.24 |
|---|---|
| [김연수] 너무나 많은 여름이(2023) (4) | 2023.12.05 |
| [김혜진] 불과 나의 자서전(2020) (4) | 2023.12.02 |
| [이화경]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2023) (1) | 2023.11.29 |
| [임솔아] 아무것도 아니라고 잘라 말하기(2021) (0) | 2023.11.04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