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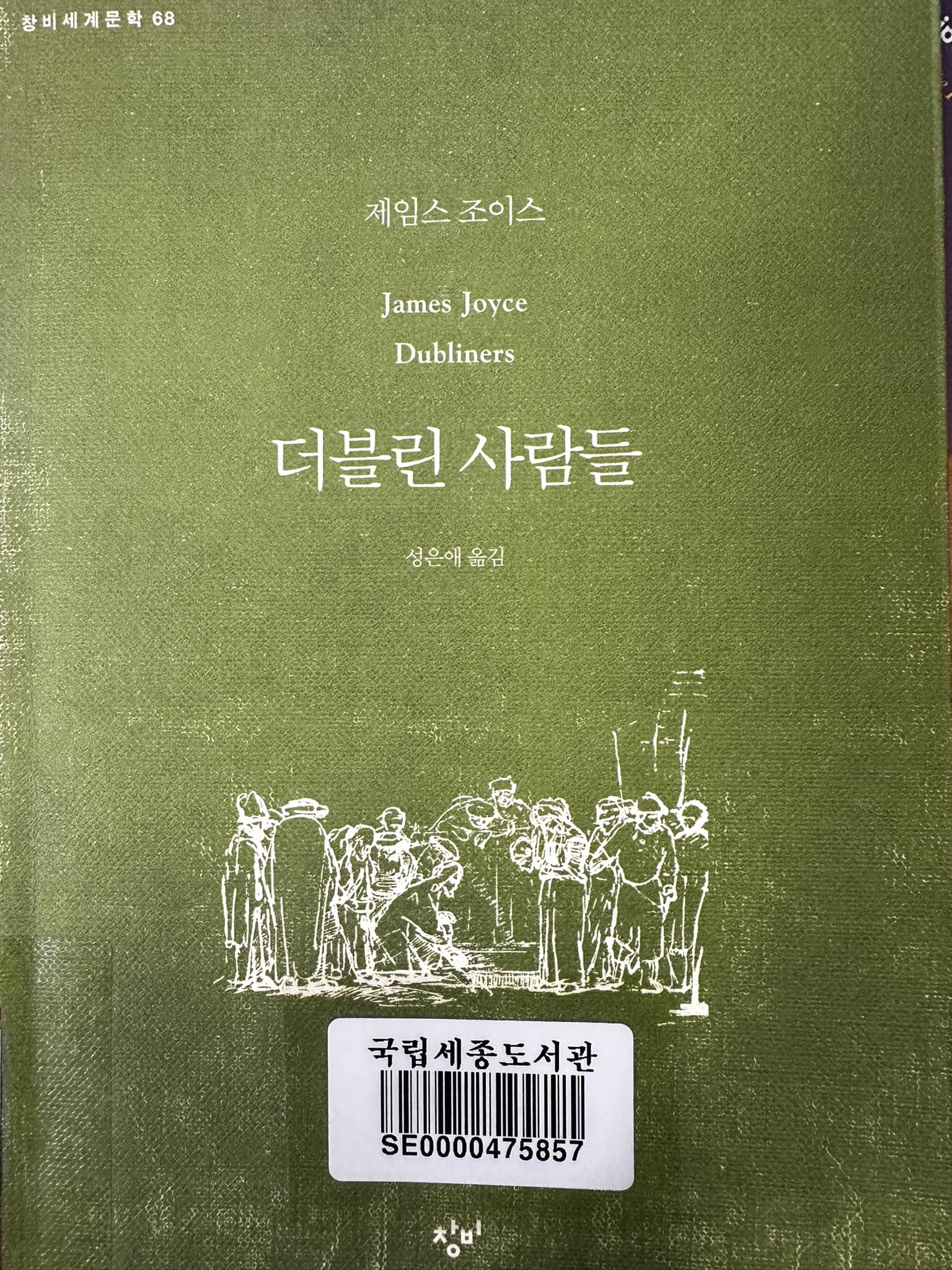
1904~1907년에 쓰여질 당시 더블린 시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포착한 제임스 조이스의 첫 단편집을 읽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넣은 <죽은 사람들>이 25세에 탈고됐다는데, 왜 아일랜드와 영국의 여러 출판사와 편집자들이 풋내기 작가가 생경한 방식으로 쓴 이 책의 출간을 왜 거절했는지 이해가 되네요.
저는 서사가 있으면서 에피파니(epiphany:평범하고 일상적인 대상 속에서 갑자기 경험하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감각 혹은 통찰)가 곁들여진 단편들을 좋아하는데요. 발자크와 체홉부터 아르투어 슈니츨러까지의 19세기 작가들의 단편집을 보면서 균형이 딱 좋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제임스 조이스의 단편들은 서사가 해체되고 독자들이 나름대로 에피파니를 느끼는 열린 서술이라 백년 전 소설이지만 현대미술작품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만큼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상도 그랬지만 모더니즘 소설은 꼭 이렇게 독자를 힘들게 해야 하는건지. 더구나 번역도 2019년에 개역된 책 답지 않게 80년대 느낌의 글투라서요.
아일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대략 15년 전이 배경이라, 1930년대 변방 식민지 대도시였던 경성에서 살던 다양한 조선인들의 삶과 생각들을 연상하며 읽었더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1914년 런던의 그랜트 리처즈 출판사가 저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라도 출판계약을 맺어서 출간되었는데, 사진집같은 느낌의 단편들을 화자의 연령대에 따라 나이가 들어가는 순서로 배치한 아이디어가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수록된 단편들 중에서 에피파니가 저한테 전달되었던 건 <가슴 아픈 사건(A Painful Case)>, <선거사무실의 아이비 데이(Ivy Day in the Committee Room), <어떤 어머니(A Mother)>, <죽은 사람들(The Dead)>였습니다.
예전 지도 중에 아일랜드 공화국을 '에이레'로 표기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게일어로 된 헌법상 국호였군요. 의무교육에서 게일어를 가르치기는 하지만 실제로 쓰는 아이리쉬들은 별로 없다던데 마치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한자와 같은 느낌을까요?
그리고, 20세기초까지도 더블린 시 안에 앵글로-노르만족 점령 이후 더블린 성벽 밖으로 쫓겨난 아일랜드 원주민들의 주거지역을 지칭하는 '아이리시타운'이라는 지명이 존재했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원주민들을 성밖에서 살게 했길래. --;
-------------------------------------------
107쪽, <구름 한 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성공하고 싶으면 떠나야 했다. 더블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턴 다리를 건너면서 그는 강 하류 쪽의 선착장 방향을 바라보았고 그 가난하고 일그러진 집들이 딱하다고 생각했다. 그 집들은 강둑을 따라 뒤죽박죽 엉겨붙어서,먼지와 매연으로 뒤덮인 낡은 코트를 입고, 해가 지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 밤의 첫 학기가 닥쳐와서야 비로소 일어나 으스스 몸을 떨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한 무리의 뜨내기들처럼 보였다.
166쪽, <가슴 아픈 사건>
그는 자신이 어떻게 달리 행동할 수 있었을까 자문해보았다. 그녀와 기만의 희극을 연출할 수야 없었다. 그녀와 공개적으로 함께 살 수도 없지 않았던가. 자기가 보기엔 최선의 행동을 한 것이었다. 그가 비난받을 게 뭐가 있나? 이제 그녀가 가고 보니 그는 밤마다 그 방에 홀로 앉아 있던 그녀의 삶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해가 되었다. 그의 삶 또한 외로울 것이고 그러다가 그 또한 죽고, 존재하기를 멈추고, 추억이 될 것이다. - 기억해주는 이가 있기나 하다면.
'독서일기 > 유럽소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하인리히 뵐/안인길 역] 아일랜드 일기(1957) (2) | 2024.11.23 |
|---|---|
| [파스칼 키냐르/류재화 역] 세상의 모든 아침(1991) (0) | 2024.10.01 |
| [빅토리아 토카레바/승주연 역] 티끌 같은 나(2014) (0) | 2021.01.28 |
| [가즈오 이시구로/김남주 역]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1986) (0) | 2020.08.06 |
| [로맹 가리/심민화 역] 새벽의 약속(1960) (0) | 2020.07.06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