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천현우 작가님덕분에 알게된 책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빈티지 남성복 전문점 <빈티지 쇼룸>에서 컬렉션한 전세계의 남성복 중 스토리가 있는 129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네요. 20대까지는 옷에 관심이 없다보니 옷의 재질과 유형들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해 잘 몰랐는데 유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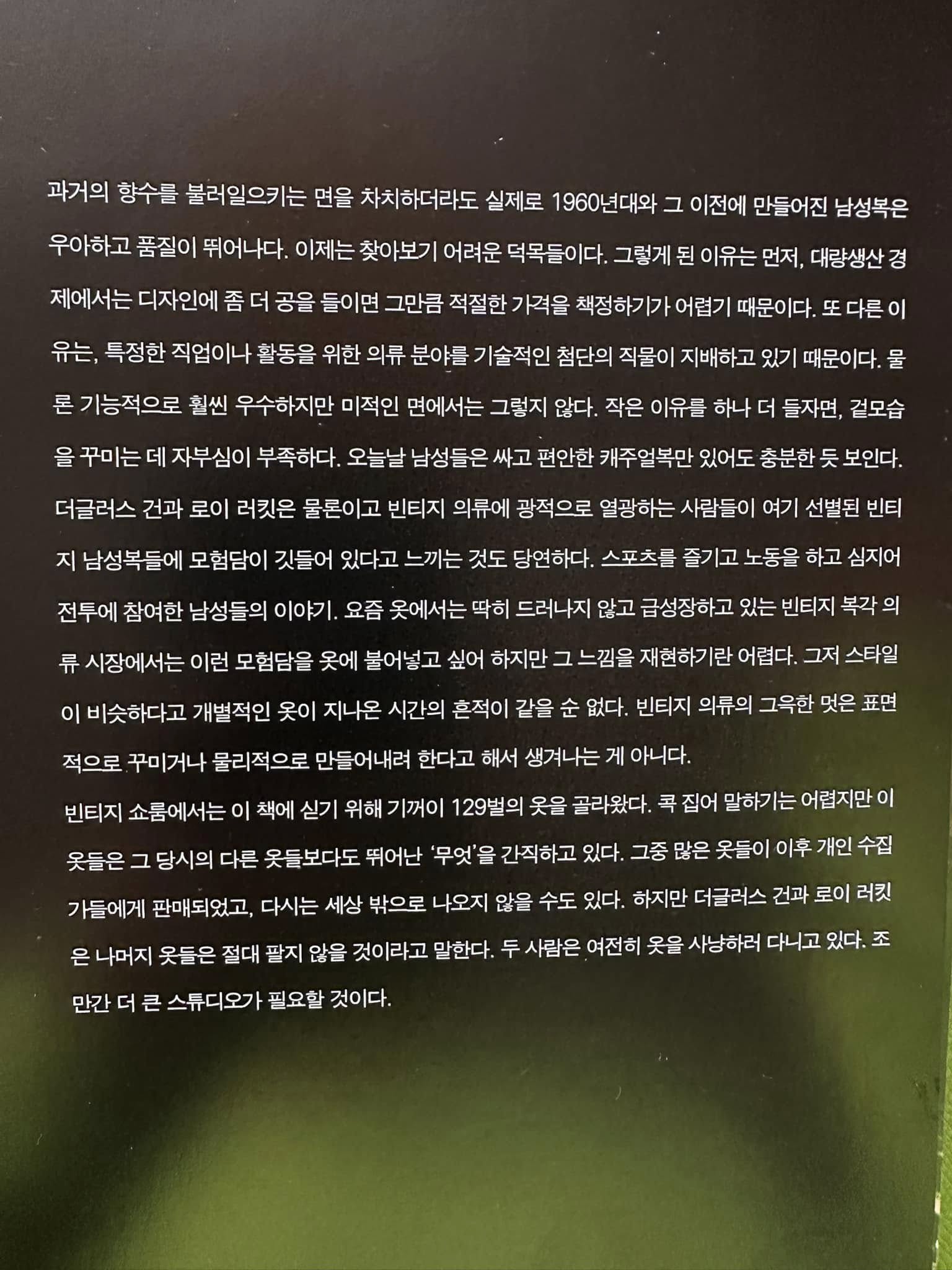
해외여행을 가면 주말 벼룩시장이나 중고옷가게 구경을 제일 좋아하는 제 취향에 딱 맞는 책이고요. 책으로 편집샵 구경을 대신하는 느낌으로 즐겁게 읽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천 년 인류 역사상 여러 가지 천연섬유가 실과 옷감으로 시도되었지만,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건 모(양털), 면(목화), 견(비단), 마(리넨) 네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동물의 가죽이 사용되었고요.
옷감을 짜는 방식이 크게 직물(woven)과 편물(knit)로 나뉜다는 걸 안지도 얼마 안되는 초보가 보기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노락(Anorak)이 북극에 사는 이누이트족이 순록이나 물개 가죽에 생선기름을 먹여 만들던 옷에서 유래했다는 점, 코듀로이가 17세기 영국 북부에서 처음 만들어졌고 데님보다 무겁지만 옷감의 강도는 같다는 점이 신기하네요.
1950~60년대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통 사람들은 옷을 1년에 한 벌을 사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작업복, 실내복, 나들이옷, 겨울외투 정도 갖추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요새는 패스트 패션의 시대라 옷이 마치 1회용품처럼 만들어지고 소비되고 있지만, 어차피 옷이 너무 많으면 뭘 입을지 고르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전 옷장 두 개에 다 들어갈 정도의 옷만 가지기로 마음 먹었고, 하나를 사면 하나를 재활용 수거함에 버리고요.
요즘은 천연섬유만 사용하고(안감 제외), 좋은 부자재를 쓰고 공들여서 만든 빈티지 옷들을 주로 삽니다. 소매가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이미 생산된 빈티지 옷과 신발들을 사서 쓰면 소비를 많이 하면서도 죄책감은 덜하다는 장점도 있죠.
나중에 늙으면 커다란 창고를 하나 사서 제가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고 콜렉션한 책과 가구, 빈티지옷들을 하나씩 팔면서 제가 모아온 살림살이들을 소중이 사용해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빈티지상점 주인장으로 여생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
109쪽
현장에서 작업할 때 편하기보다는 권위를 부여하는 게 목적인 군용 맞춤복의 역사는 정부가 커미션을 받고 테일러 숍에 의류 제작 방침을 내리고, 장교들이 해당 업체를 찾아가 제복을 직접 구입하던 시대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독서일기 > 패션&인테리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연이] 옷을 입다 패션을 만들다(2024) (1) | 2025.02.23 |
|---|---|
| [박세진] 레플리카(2018) (0) | 2025.02.23 |
| [장보라] 새로 태어난 마이홈 인테리어(2022) (0) | 2023.01.29 |
| [권용식] 마이 디어 빈티지(2022) (0) | 2022.06.25 |
| [이경미, 정은아] 우리는 취향을 팝니다(2019) (0) | 2020.10.29 |





댓글 영역